정말 -이 정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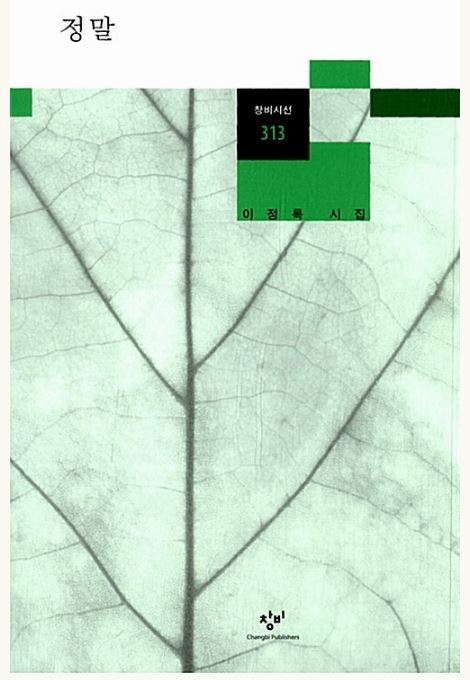
어느 날 고향 친구 단톡방에 올라온 이정렬 시인의 '참 빨랐지 그 양 반'이라는 시를 보고
이 책을 구입하게 됐다.
시가 예뻤다면 말이 되려나?
요즘책 같지 않게 표지가 화려하지 않고 책도 얇다.
책 내용만큼이나 책 껍데기도 수수하다.
두께가 1cm도 안된다. 정확하게 재 보니 0.9cm다.
올해 들어서 산 책 중 책값이 만 원이 안 되는 책은 처음이다.
소설이 아닌 시집인데도 재미가 있어서 단 숨에 다 읽었다.
시는 천천히 음미해 가면서 읽는 것이겠지만 이 책은 시가 소설만큼이나 재미있다.
화장실이 아닌 칙간이나 통시에 두고 읽으면 더 맛이 날 것 같다.
옆집 아지매나 고향 친구와 선술집에서 나누는 정깊은 이야기 같은 느낌의 글로
시라기보다 그냥 이야기 같다.
시와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지만 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다.
시인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시의 많은 부분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우리 집 화장실에는 박노해 시인의 시집 대신 곧 이 시집이 자리를 바꿀 것 같다.
시인의 시는 아파트 거실보다는 시골집 툇마루에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
한 번에 다 읽고 싶더라도 한 번쯤은 책을 덮고 눈을 감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읽다가 차 향이 생각나면 커피보다는 둥굴레차 한 잔이 더 진한 향이 날 것 같다.
'마흔셋을 읽고' 술 생각이 난다면 치맥보다는 막걸리에 겉절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홍어'를 읽으면서 속울음이 나서 막걸리 거품처럼 웃어도 괜찮다. 당신 탓이 아니다.
갑자기 하늘을 보고 싶다면 아침 하늘보다는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늘접시'를 읽고 부모님 생각이 난다면 찔끔 눈물 닦아내지 말고 펑펑 울어도 좋을 것 같다.
'물길'은 어머니를 찾게 만들고, '악필'은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
'명아주'를 읽고 쉬고 싶다면 산책보다는 마을 길 끝 바위 위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있었으면 좋겠다.
매시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낮달 '을 보며 몇 시간쯤은 그냥 누워만 있어도 좋을 것 같다.
흥이 난다면 트로트보다는 7080의 통기타 노래를 듣기를 권한다. 휘파람을 곁들여도 좋을 것 같다.
옛 추억이 생각난다면 몇 년간 연락 없던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보리앵두 먹는 법'을 읽을 때는 고향마을 앞개울에 냇물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옆걸음'을 읽다가 갑자기 옆지기가 예뻐 보인다 싶을 때는 살짝 안아줘도 좋을 것 같다.
옆지기가 실눈을 뜨고 웃으면 뽀뽀 한번 해 주며 같이 씩 웃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반달 편지함'을 읽을 때는 옆지기 몰래 첫사랑을 생각하며 잠시 옛 생각에 젖어도 죄스럽지 않을 것 같다.
'국밥 한 그릇'을 읽다가 배에 시장기가 돌면 파스타보다는 애호박 썰어 넣은 된장국에 보리밥이 더 맛 날 것 같다.
'참 빨랐지 그 양반'은 우습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해서 웃프다는 요즘 신조어가 생각났다.
"얼마나 빨랐던지 그때까지도 오토바이 뒷바퀴가 하늘을 향해 띠그르르 돌아가고 있더라니까"에서는
웃음이 절로 났다.
'눈을 비빈다는 것'을 읽으며 국민학교 시절을 추억해도 좋다.
'역전쌀상회'를 읽는데 왜 쌀장사를 하지도 않은 외할머니가 생각나는지 모를 일이다.
'멍에'는 내 아버지의 힘든 삶, 그 등에 앉은 지게 같아서 더 안쓰럽다.
이제껏 읽은 시집 중에서 제일 와닿는 시집이다.
책의 맨 뒤쪽에 있는 시인의 말을 덧붙인다.
쓰는 게 아니라
받아 모시는 거다.
시는, 온몸으로 줍는 거다.
그 마음 하나로
감나무 밑을 서성거렸다.
손가락질은 하지 않았다.
바닥을 친 땡감의 상처, 진물에 펜을 찍었다.
홍시 너머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사랑의 주소는 자주 바뀌었으나,
사랑의 본적은 늘 같은 자리였다.
그리고 이 시집을 사게 만든
'참 빨랐지 그 양반'과 '홍어' '잔설'을 첨부한다.
-참 빨랐지 그 양반-
신랑이라고 거드는 게 아냐
그 양반 빠른 거야 근동 사람들이 다 알았지
면내에서 오토바이도 그중 먼저 샀고
달리기를 잘해서 군수한테 송아지도 탔으니까
죽는 거까지 남보다 앞선 게 섭섭하지만
어쩔 거야
박복한 팔자 탓이지
읍내 양지 다방에서 맞선 보던 날
나는 사카린도 안 넣었는데
그 뜨건 커피를 단숨에 털어 넣더라니까
그러더니 오토바이에 시동부터 걸더라고
번갯불에 도롱이 말릴 양반이었지
겨우 이름 석자 물어본 게 단데 말이여
그래서 저 남자가 날 퇴짜 놓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서 타라는 거여
망설이고 있으니까
번쩍 안아서 태우더라고
뱃살이며 가슴이 출렁출렁하데
처녀적에도 내가 좀 푸짐했거든
월산 뒷덜미로 올라가더니
밀밭에다 오토바이 팽개치더라고
자갈길에 젖가슴이 치근대니까
피가 쏠렸던가 봐
치마가 훌렁 뒤집혀
얼굴을 덮더라고
그 순간 이것이 이녁의 운명이구나 싶었지
부끄러워서 두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정말 빠르더라고
외마디 비명 한 번에 끝났다니까
꽃무늬 치마를 입은 게 다행이었지
풀물 핏물 찍어내며 훌쩍거리고 있으니까
먼 산에다 대고 그러는 거여
시집가려고 나온 게 아니냐고
눈물 닦고 훔쳐보니까 불꽃같은 불곰 한 마리가
밀 이삭만 씹고 있더라니까
내 인생을 통째로 넘어뜨린 그 역사가
한순간에 끝장나더니
하늘이 밀밭처름 노랗더라니까
내 매무새가
꼭 누룩에 빠진 흰쌀밥 같았었지
얼마나 빨랐던지 그때까지도
오토바이 뒷바퀴가 하늘을 향해 띠그르르
돌아가고 있더라니까
죽을 때까지 그 버릇 못 고치고 갔어
덕분에 그 양반 바람 한번 안 피웠어
가정용도 안 되는 걸
어디 가서 상업용으로 써 먹겠어
정말 날랜 양반이었지
-홍어-
욕쟁이 목포홍어집
마흔 넘은 큰아들
골수암 나이만도 십사 년이다
양쪽다리 세 번 톱질했다
새우 눈으로 웃는다
개업한 지 이십팔 년
막걸리는 끓어오르고 홍어는 삭는다
부글부글,을 벌써 배웅한
할매는 곰삭은 젓갈이다
겨우 세 번 갔을 뿐인데
단골 내 남자 왔다고 홍어 좆을 내온다
남세스럽게, 잠자리에 이만한 게 없다며
꽃잎 한 점 넣어준다
서른여섯 뜨건 젖가슴에
동사한 신랑 묻은 뒤로는
밤늦도록 홍어 좆만 주물럭거렸다고
만만한 게 홍어 좆밖에 없었다고
얼음막걸리를 젓는다
얼어 죽은 남편과 아픈 큰애와
박복한 이년을 합치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삼합이라고
소주병을 차고 곁에 앉는다
우리 집 큰놈은 이제
쓸모도 없는 좆만 남았다고
두 다리보다도 그게 더 길다고
막걸리 거품처럼 웃는다
-잔설-
산 채로 털을 뽑다가 오리를 놓쳤다
털 뽑던 손아귀로 달포쯤 모이를 줬다
잔설의 몸뚱어리가 밥그릇 멀리 서성거렸다
깃털이 뽑혀나간 자리마다 얼음이 박혀 있는지
멍이 들어 있었다 물을 끓이고 잔털을 마저 뽑아내자
오죽 같은 무릎마디에서 피리 소리가 새어 나왔다
꽥꽥거리던 트럼펫 안에 검은 피가 고여 있었다
뒤뚱뒤뚱 신물이 올라왔다 발톱이 찍혀 있던
마음 안팎에서 새싹처럼 소름이 돋았다.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쉰아홉 아내의 생일에 (4) | 2022.10.10 |
|---|---|
| 불편한 편의점 2 (2) | 2022.09.30 |
| 달러구트 꿈 백화점 (4) | 2022.09.22 |
| 고래 -천명관 (4) | 2022.09.16 |
| 늙는다는 착각 (6) | 2022.08.23 |



